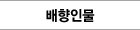 |
1)주향-최병심(崔秉心) 1874(고종 11)∼1957
한말의 유학자.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경존(敬存) 호는 금재(欽齋). 전주출생.
16세에 청하(靑下) 이병우(李炳宇)에게 사서 및 주역, 춘추, 서경 등을 배우고 23세에는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을 뵙고 근사속록(近思續錄) 1부를 받고 24세에 태안으로 가서 간재(艮齋) 전우(田愚)를 스승으로 모셨다. 1904년(31세)에 명릉참봉(明陵參奉)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고 1905년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체결에 오적선참(五賊先斬)의 격문(檄文)을 전국각지 지사들에게 돌리다 임실경찰서에 구속되다. 1910년(39세) 한일합방 후 항일의병대 이석용대장과 임자동밀맹단(壬子冬密盟團)전주책임자로 민족봉기운동을 전개하다. 1915년(45세)에 괴산 만동묘(萬東廟)철폐시 정향문제(庭享問題)로 탄핵하는 통문을 돌리다가 괴산경찰서에 구속되다. 또 고종황제 무복설(無服說)을 주장하는 조긍섭을 반박하는 《고팔역사문 告八域士文》을 지어 전국유림에게 돌리고 삼년 상복을 입다. 1918년 옥류정사가항일사상의 본거지로 전국각지에서 운집하는 지사들의 왕래를 저지하기 위하여 왜정은 전주잠업소(全州蠶業所)설치를 명분으로 대대로 전수해온 대지를 매도하라고 강요하자 일제에게는 토지를 내줄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하니 토지수용령을 강제 발동시켜 가옥이 모두 소실당하면서도 지조를 굽히지 않으며 오히려 단식투쟁으로 대결하다. 1919년(46세)에 《성사심제 재변이 性師心弟 再辨二》를 저술하다. 1937년(64세) 독립투사 비사(秘史)를 엮은 조희제(趙熙濟)의 《염재야록 念齋野錄》에 민족자존의 의지를 밝혀 서문을 쓴 일로 임실경찰서에서 옥고를 치르다. 1949년(76세)에는 성균관 부관장으로 추대되었으나 사양하고 초야에 묻혀 유학의 본질인 도학과 의리 정신을 지켜가면서 후학들을 양성하는 높은 뜻을 실천하시다 1957년 84세로 옥류동 염수재(念修齋)에서 서거하다. 항일사상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독립운동가로 기록되며 1990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 받다.
학술과 사상은 사람이 음양·흑백을 분별할 줄 모르면 소인·난적이 되기 쉽다고 전제하고, 같은 계열의 학파라도 학문의 진리에 어긋나는 논설은 가차없이 엄단하게 분석하여, 태극(太極)·심성(心性)·이기(理氣)·의리론(義理論) 등 많은 잡저를 저술하였다. 천하의 지극히 높은 것이 성(性)이요, 백체의 가장 영묘한 것은 심(心)이다. 그러나 심(心)은 때로는 욕망에 흐르기 쉬움을 경계하여야 하므로 성(性)을 높여 도(道)를 스승으로 삼고 성경(誠敬)으로 심(心)을 조절하면 성(性)과 심(心)이 일치되어 사람이 곧 천리(天理)에 부합됨을 강조하였다.
스승인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학설을 충실히 계승하고 수도자청(修道自請)과 항일의리론(抗日義理論)의 서술을 통해 국난 속에서도 도(道)가 지켜진다면 국가도 회복할 수 있다는 신념아래 수의(守義)의 길을 택해 강학하며 항일 활동에 힘썼던 삶속에서도 유저(遺著)로는 시 1천여 편과 철학에 관한 잡서 12권, 《간재척독 艮齋尺牘》3권, 그리고 일제의 수사망을 피해 심지에 말아 인편으로 주고 받았던 편찰 수백 건이 전해지고 있다. 문집으로는《금재문집 欽齋文集 》30권 14책이 있다.
2)배향-라진선(羅鎭旋) 1905(고종광무 을사)∼2001
근세 유학자,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자홍(子弘), 호는 정재(正齋), 김제 출생.
9세에 정사성재 선생에게 입문하고 10세에 시구절(春花 向我笑 白雲 片片閒) 작문하다. 1925년(20세)에 호남의 대 유학자 금재선생 문하에 입문하다. 2월에 스승을 모시고 현동 간재묘소를 성묘하니 금재 스승께서 중용. 논어장구와 귀고산시를 주시며 오도유탁(吾道有托)이라 하고 정재(正齋)라 호를 내려 주시다. 1942년에 사문 이태현의 순절함을 듣고 만장을 지어 슬퍼하다. 1943년 왜경의 삭발 명령에 삭발하면 승(僧)이요 삭발하지 않으면 유(儒)라고 죽기로 항거하며 독보의발(獨保衣髮)하다. 1949년 성균관장 김창숙의 문묘현철위패매안(文廟賢哲位牌埋安)의 부당함을 장문을 지어 성토하고 1950년 동란 중 김제향교 폭격에 훼손된 대성전에 들어가 문선왕묘에 존작위안(尊爵慰安)을 행한 뒤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며 조선세기 6권 저술하다. 1957년 스승의 서거이후 행장록을 선하고 문집을 발간하다. 스승을 부모님처럼 모신 지극한 의리로 1984년 율산서원을 건립하고 스승을 배향하다.
신학문이 도입되며 사문(斯文)이 쇠퇴하는 시기에 태어나 역사적 상황의 불안정과 격변 속에서도 사서삼경을 탐구하며 스승의 학문을 계승하는 데 진력을 다함으로써 호남 유학의 명맥을 이어왔다. 성리의 근원에서 진리를 추구하여 성품을 높이고 마음을 낮춘다(性尊心卑)는 것과 성품이 스승이라면 마음은 제자이다(性師心弟)라는 주장을 계승, 발전시켰다. 말년까지 경독겸행(耕讀兼行)을 실천하며 금석학의 최고 권위자로 수백수의 비문을 해독하고 향리에서 수많은 후학을 배출하였다. 저술에 《조선세기 朝鮮世紀 》6권.율교문답, 문집 6권 |
